31. 누가 나그네인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신명기 10:1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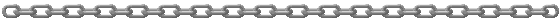
|
한 젊은 목회자가, 성서에 보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했는데, 나그네보다 더 다급 한 사람들이 있는데, 언제 나그네까지 돌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 목회자는 자기의 집과 교회 건물을 아예 노숙자(露宿者)나 부랑자(浮浪者)나 걸인(乞人)에게 내놓은 사람이다. 여 관마저 갈 형편이 못되는 사람들이 와서 자고 가고, 술 취한 사람도 와서 자고 간다는 것이 다. 술 취한 걸인의 경우는 옷을 입은 채로 대소변을 보는데, 자신이 대변이나 소변을 보았 다는 사실 마저 모르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런 경우에는 옷 속의 대변이 말라서 걸음을 옮길 대마다 그 조각이 바지 사이에서 떨어져 나온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을 맞아 돌보아 주기에도 자기가 맡고 있는 교화로서는 좀 벅찬 형편이어서 아직 한 번도 "나그네" 를 대접해볼 여유까지는 없었다고 한다. 그 젊은 목사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세대차(世代差) 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처음에는 그 젊은 목사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다. 50대 후반인 나는 "나그네"라는 개념을 넓게 생각 하는데, 그래서 그가 맞이한 노숙자나 걸인을 성서가 말하는 "나그네"와 아무런 부담 없이 일치시키는데, 이 젊은이는 낱말 사이의 유사점은 극소화하고 차이점은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에게는 "나그네"와 "노숙자"와 "걸인"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 다. 60년대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모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이 성만찬을 베풀면서 "포도 주"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 고유의 "막걸리"와 "송편"을 사용한 일 이 있어서, 교계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그것은 다분히 토착화신학에 영향을 받은 탓이 었다. 포도주도 빵도 다 이국적인 것이므로 우리의 것인 막걸리와 송편으로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는 것이 한국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썩 좋은 대안이 못되었 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빵은 주식(主食)에 속한 것이었는데 반 해 우리의 막걸리와 빵이나 떡은 주식이라기보다는 주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적절히 선택 된 대응 관계는 못 되었다. 특히 빵은 그들에게는 주식이었는데 반해,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빵이나 떡은 별식(別食)이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 {성경전서 표준 새번역}(1993)을 번역하 던 80년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다. 한 보수교단의 젊은 목회자가 성만찬 예식을 베풀 때, "포 도즙"과 "송편" 떡을 사용한 것이다. 그의 생각에 포도주(葡萄酒)는 문자 그대로 포도로 만 든 "술"이므로, 교회가 벌이고 있는 "금연금주" 절제 운동에 어긋나며, 성경에도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라고 했는데, 그 잔이 반드시 포도주가 담긴 "술"잔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에 서, 그리고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1961) 그 어디를 보아도 성만찬에서 사용된 요소가 "떡" 이었지, 결코 "빵"은 아니더라고 하면서, "송편" 떡을 고집했다는 것이다. 이 때에도 나는 세대 차를 느꼈다. 나는, 우리 {개역}의 "떡"을 "먹거리"라는 넓은 의미 로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고, 지금도 없다. 그러나 우리의 젊은 목회자는 "떡"과 "빵"을 절대로 혼돈하지 않고 있다. 어디 이 젊은 목회자뿐이겠는가? 식품점에 가서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주고,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는 엄연한 차이를 잘 알고 있는 젊은 목 사는, {개역} 성서 번역자들이 "떡"이라는 말에 함축시킨 폭넓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옛 번역자들의 어휘 이해와 현대의 독자들의 어휘 이해가 그만큼 서로 달라졌다는 점을 착안하게 된다. 이제 우리말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어느 계층을 가 리키는 사회학적 용어라기보다는, 다분히 낭만이 긷든 문학적 표현 용어이다. "인생은 나그 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최희준의 "하숙생"이 그러하고, "오늘도 걷는다 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욱마다 눈물 고였네. 선창 가 고동소리 옛 임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를 부른 백년설의 "나그네 설음"이 그러하다. 성서가 말하는 "나그네"는 외국인이 아닌 자국인(自國人)에서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에 게서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나그네는 본토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친족이나 고향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호나 이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쉴만한 집도 없이, 정착할 땅도 없이, 일정한 직업도 없이,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돌며 사는 사람들이다. 나 그네를 잘 돌보아야 한다고 하는 구약의 법은, 이스라엘 역시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 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를 환대하도록 한 것이다. "너는 이방 나그 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출 23:9).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 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 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 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신 10:17-19). 이 러한 구절에서 보듯이 성서가 말하는 나그네는, 외교법상 보호를 받는 오늘날의 외국인과는 다른, 고아와 과부처럼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적 피보호 대상과 늘 함께 언급되는 타국인이 다. 성서의 나그네는 여행을 취미 삼아 하고 있는 무전여행자나 외국인 관광객 같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나그네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를 들라면, 코리안 드림 을 가지고 한국에 밀입국하여 불법 취업을 하면서 온갖 학대를 받고 있는 제 3세계 노동자 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성서 번역을 부단하게 지속적으로 해야할 이유 중에,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말의 뜻이 바 뀌기 때문에 번역을 다시 해야 한다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성서를 새로 번역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기존의 번역을 읽는 경우라 하더라도 "나그네"가 언급되는 문맥을 보면 그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아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다만 성서 독자의 머리 속 에, 전체 맥락보다는, 어떤 특수한 낱말만이 강하게 각인이 되는데다가, 그 낱말이 원어에서 지닌 의미의 영역과 번역된 말에서 지니고 있는 의미의 영역이 서로 다른 데에서 오는 의미 전달의 혼란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부랑자(浮浪者)나 노숙자(露宿者)는 돌보면서 "나그네"까지는 돌보지 못한다고 하는 한 젊은 목회자에게 그가 이미 나그네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고, 불법 입국하여 부 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성서가 말하는 "나그네"의 범주에 든다는 것을 밝 히고 싶다. |
'관심 사 > 종교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 33. 이[蝨]를 내려 하였으나 (0) | 2011.11.21 |
|---|---|
| 32. 말씀 앞에서의 당혹은 오히려 은총 (0) | 2011.11.21 |
|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새성호입니다./멜기세덱교 (0) | 2011.11.21 |
| 30. 만물의 으뜸이신 주님(골로새 1:15) (0) | 2011.11.21 |
| 29. 이집트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0) | 2011.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