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하여 프리드리히 1세는 먼저 교황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일에 착수, 즉위 이듬해인 1153년에 교황과 콘스탄츠 협약을 맺어 “황제는 교황의 교회 지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교황은 황제의 권위를 지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로써 프리드리히는 서임권 문제에서 교황에게 원칙적 양보를 하는 한편 왕권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리고 다음 해에 이탈리아 왕에 즉위하고, 그 다음 해인 1155년에는 로마로 가서 정식으로 황제에 즉위했다. 하지만 즉위식은 성난 로마 시민들의 소요 때문에 도중에 끝나고 말았다. 당시 로마 시민들은 교황이 로마를 세속 영주처럼 지배하는 것에 반대하며 고대 폴리스와 같은 자치 정부를 세우려고 했다. 그리고 교황과 맞서기 위해 황제의 힘을 빌리려 했는데, 샤를마뉴의 열렬한 숭배자였던 프리드리히는(그는 1165년에 샤를마뉴를 성인으로 축성하기도 했다) 샤를마뉴처럼 교황을 돕고 그의 축복을 받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하지만 교황과의 밀월관계는 오래지 않았다. 교황은 노르만족의 침공 등에서 프리드리히가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한 데 실망했고, 프리드리히는 교황이 자신을 “신하 취급”하는 서신을 보낸 일에 분개했다. 여기에 오토 1세 이래 독일 왕들의 중요한 영지였던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 단결하여 황제에 반기를 들었다.
결국 프리드리히 1세는 힘에 의지하기로 했다. 1158년에 밀라노를 점령해 북부 이탈리아의 반란에 쐐기를 박았고, 1166년에는 교황 알렉산데르 3세에 대항해 자신이 내세운 대립교황 파스칼 3세를 보호하고자 로마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말라리아로 많은 병사들이 쓰러진 틈을 타서 교황과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이 손을 잡고 프리드리히를 몰아붙여, 그는 소수의 병력만으로 간신히 알프스를 넘어 독일로 돌아갈 수 있었다. 1174년에도 다시 이탈리아로 들어갔지만 병력이 부족해져서 벨프 가의 하인리히(하인리히 사자공)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리고 레냐노 전투에서 대패함으로써(1176년) 프리드리히는 교황과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평화 협정을 맺어야 했다. 이로써 프리드리히 1세는 샤를마뉴의 길을 따르기 위해 ‘교황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여섯 차례 이탈리아 원정을 벌였으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아들 하인리히를 시칠리아 왕국의 콘스탄스와 결혼시켜 장차 남부 이탈리아를 손에 넣고 교황령을 포위할 구도를 만들었으며, 프랑스와 연대를 시도하고 부르고뉴의 왕권도 얻어 제국의 세력권을 확대할 교두보를 쌓았다.
봉건질서에 맞서 제국의 건설을 꿈꾸다

프리드리히 1세는 단지 봉건질서에 따른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닌 제국’의 황제로 만족하지 않고, 고대의 로마 황제처럼 영토 구석구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했다. 어머니가 벨프 가문 사람이었던 그는 본래 호엔슈타우펜의 라이벌인 벨프 가에 우호적이었으나, 하인리히 사자공이 1174년에 병력 지원을 거절한 일을 빌미로 그를 제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1180년에 그를 독일에서 추방하고 영지를 몰수했다. 하지만 ‘귀족의 대표자’인 황제가 유력한 귀족을 그처럼 철저히 제거하는 일은 법적, 정치적으로 무리가 따랐다. 그래서 프리드리히는 하인리히에게서 빼앗은 영지를 자신을 지지해 준 귀족들에게 나눠줄 수밖에 없었고, 이를 ‘강제수봉제’로 법제화해야 했다. 그렇다면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직할령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셈이었다.
그래도 프리드리히가 여기서 “남 좋은 일만 시킨” 것은 아니다. 빼앗은 땅을 나누어주며 기존의 관습적인 영지 배치와 다른 새로운 영지 배치를 황제의 손으로 결정할 수 있었고, 황제에게 영지를 받은 귀족들은 ‘제국 제후’로서 황제에게 직속되는 가신이 되었다. 프리드리히는 또한 “황제는 그 누구의 신하도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사법 질서도 개편하여 사형을 포함하는 중범죄는 황제에게만 재판권이 있도록 했다.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를 수립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웅대한 구상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웠다. 황제에 직속한다지만 제국 제후들의 충성을 보장할 수단이 없었고, 각 지방의 실권은 여전히 지방 영주들의 손에 있었다. 이를 극복하려면 강력한 중앙 관료제가 필요하다고 여긴 프리드리히는 귀족이 아닌 신분에서 ‘미니스티알렌’이라는 가산 관료단을 선발하여 황제 직할지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기도 했다.
예루살렘을 보지 못한 죽음, 그러나 전설은 시작되다

프리드리히 1세는 불타는 듯한 수염과 건장한 키로 보는 이의 눈을 사로잡았다. 또한 뛰어난 검술과 말솜씨, 흠잡을 데 없는 예의범절 등으로 ‘기사도의 모범’이라 불렸다. 이런 개인적인 카리스마는 허약한 제국의 권력 기반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다. 1184년에는 마인츠 궁전에 유럽 각지의 기사들을 초빙해 만찬을 가졌는데, 7만 명이 모여 프리드리히를 연호하는 모습은 마치 유럽이 그의 발 아래 하나로 통일된 듯한 환상을 주었다고 한다. 이런 이미지를 한껏 고취하려 했음인지, 그는 1189년에 제3차 십자군에 참여하기로 한다. 그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아시아에 상륙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다. 살라딘이 이끄는 이슬람 진영은 긴장했으나, 프리드리히 1세는 원정 도중 살레프 강에서 67세의 나이로 익사하고 만다(1190년). 그가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이야기가 여럿인데, 낙마하여 차디찬 강물에 떨어지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도 하고, 목욕을 하다가 뇌졸중이 왔다고도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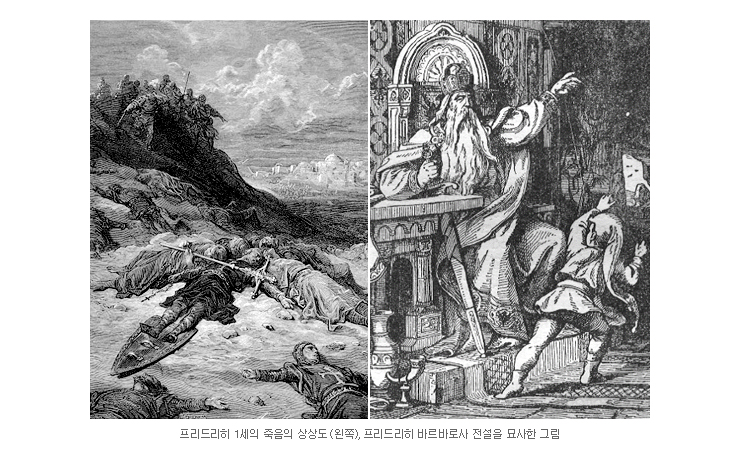

 ‘위대한 기독교 전사 군주’라는 이미지를 심고, 후대에 전설로 남은 군주들
‘위대한 기독교 전사 군주’라는 이미지를 심고, 후대에 전설로 남은 군주들 프리드리히 1세
프리드리히 1세
 샤를마뉴
샤를마뉴
 고드프루아 드 부용
고드프루아 드 부용
 리처드 1세
리처드 1세



